배이슬의 기후월령가 | 울긋불긋 산벚 피면 못자리하는, 곡우
- hpiri2
- 6시간 전
- 4분 분량
2025-04-24 배이슬
벼농사를 시작하는 곡우. 못자리할 때 피던 산벚이 모내기할 때 피는 조팝나무와 함께 피었다. 못자리와 모내기를 함께하라는 건가. 2022년부터 봄꽃인 벚꽃과 조팝나무 사이로 여름꽃인 오동나무꽃마저 피었다. 이제는 꽃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하다. 이런 때 '눈이 내리다니'라며 한마디씩 했다. 온갖 꽃이 핀 꽃천지야말로 슬프고 이상한 일이다.

배이슬 이든농장 농부 / 한국퍼머컬처네트워크 공동대표활동가 / 진안생태텃밭강사
산골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다. 농사로 익힌 다름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지속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며, 농사를 알리고 가르치고 있다. 모든 존재가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안전한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려 애쓴다. 일터인 '이든농장'은 전라북도 진안에 위치한 작은 농장이다. 논, 밭, 산이 조금씩 있고, 자급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작물들을 심고 키우고 먹는다. 씨앗을 받고, 퍼머컬처 숲밭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곡식을 깨우는 비, 곡우
곡우는 곡식을 깨우는 비가 내린다는 뜻이다.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 ‘곡우에 모든 곡물이 잠을 깬다.’는 말이 있다. 하늘과도 같던 ‘밥’, 벼농사의 시작이니 중요한 때다. ‘곡우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곡우에 가물면 땅이 석 자가 마른다’라는 속담도 있다. 벼농사에 이맘때 비는 간절하다.
그래서 곡우는 논농사의 시작, 볍씨를 담그고 못자리를 하는 때다. 심을 논의 크기와 심을 볍씨의 종류를 세심하게 살펴서 볍씨를 물에 담근다. 낮 동안은 담궈 놓고, 밤에는 건져 두며 물도 먹고 숨도 쉬게 한다. 며칠이 지나면 싹과 뿌리가 함께 뾰족뾰족 아기이빨 같은 촉이 난다. 논을 갈아가며 물을 대야 논 하나에 물을 받는다. 흙은 말라 물이 잘게 드는데, 욕심껏 물을 댈 수는 없다. 논물이 드는 물길은 모두 연결된 커다란 핏줄 같아서 한 곳에만 잔뜩 대면 다른 논들은 더 깊이 마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수지며 둠벙에 모아둔 물만으로는 속이 타는 때라 비가 귀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마른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는 말이 생겼을까. 과연 올해 곡우에도 곡식을 때우고 기름지게 할 귀한 봄비가 내릴까?

울긋불긋 산벚 피면 못자리하는 때, 들판에 조팝나무 하얗게 피면 모내기하는 때
할머니는 이맘때 자주 마을의 산들을 가리키며 말하고는 했다.
“울긋불긋 산벚 피면 못자리하는 때, 들판에 조팝나무 하얗게 피면 모내기 하는 때여”
꽃이 말해 주는 때에 맞춰 농사를 짓는 지혜였다.
2013년에는 할머니 이야기대로 꽃에 맞춰 농사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게 잘 맞았다. 생강나무 꽃피고 나면 매화가 피고, 그 후에는 목련과 벚꽃, 조팝나무가 차례로 피었다. 일찍 일어난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차례를 이어 주는 것 같았다. 온도가 차곡차곡 쌓여 각각의 꽃이 필 만큼의 “때”가 있다.
그래서 들판과 산을 둘러보며 밭에 가는 길은 ‘때를 읽게 되는 것, 계절을 아는 것은 농부라서 누리는 호사였다. 생강나무와 수선화를 보면 아 봄이구나, 오동나무꽃을 보면 여름이구나 하고 ‘꽃이 하는 말’을 들었다. 제법 꽃이 하는 말들을 알아들을라칠 즈음 모든 것들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2019년부터였다.

슬픈 꽃천지에 내리는 눈
산벚이 조팝나무와 함께 피기 시작했다. 못자리와 모내기를 함께하라는 건가. 2022년에는 벚꽃과 조팝나무 사이 오동나무꽃마저 피기 시작했다. 이제는 꽃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올해는 꽃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세상을 꽃천지로 만들었다. 다들 예쁘다고 나들이하고 사진을 찍는데 함박눈이 펑펑 쏟아졌다. 5월까지도 눈이 자주 왔던 것을 떠올리면, 진안 4월의 눈이야 어색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날씨가 이상해, 이런 때 눈이 내리다니라며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모두 피어 있던 꽃천지야말로 슬프고 이상한 일이다.
울긋불긋 산벚이 피었는데, 함박눈이 왔다. 사진_배이슬

사라져 버린 못자리, 품앗이
못자리는 힘과 손이 많이 드는 일이었다. 부러 말하지 않아도 마을 어른들은 모판에 흙을 담고 있는 곳을 찾아와 함께 흙을 담았다. 못자리하는 날, 이른 아침 여럿이 한 집 못자리를 끝내면 배불리 밥을 먹고, 두 번째 집에 가서 못자리를 하고, 세 번째 집의 못자리를 했다. 그렇게 며칠을 하고 나면 안 쑤시는 삭신이 없다. 씨앗과 흙을 고르게 유지해야 모도 고르게 나니 모판은 힘으로 뿔떡 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루종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았지만, 우리 집 것만 하고 쉬면 편할텐데 싶어 매년 몰래 못자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렇게 한 분 두 분 나이가 들어 논을 내어 주거나, 지역농협에서 제공하는 모판을 사서 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못자리 품앗이가 사라졌다. 그제서야 몸에 익어 잰 속도로 요령으로 함께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덕에 그나마 쉬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집은 2022년까지 마을에서 마지막 못자리하는 집이었다. 사진_배이슬
점점 ‘못자리’가 사라져 가는 무렵 마을에서 유일하게 못자리를 했다. 하우스에 깔아 놓고 물 줘서 키우면 모찌듯이 달라붙은 모판을 논에서 떼는 일을 하지 않아 편할 것 같았는데 할머니는 한사코 모는 논에서 커야 한다고 물놋자리를 고집했다. 할머니는 자타공인 모 키우기 선수였다. 처음 모가 자랄 때는 조금 작은 것 같다가도 모 심을 때가 되면 균일하게 단단히 자라 남은 모판을 기다렸다가 받아가는 집도 많았다. 할머니는 못자리에서 물을 균일하게 흠씬 주었다가 떼는 것, 적당한 때에 덮은 것들을 걷는 것이 모를 고르게 키우는 비법이라고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물못자리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을에 함께 못자리할 사람도 없었다. 결국 마지막까지 직접 물못자리를 하던 우리도 못자리를 포기했다. 너무 어려운 일이라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벼농사, 논농사에서 모를 찌는 일, 못자리를 하는 일 같은 ‘동사’가 점차 사라져 간다.


곡우에 하는 농살림
봄이 끝나가니 이른 아침 된서리가 줄어든다. 곡우 즈음에는 무엇이든 심는 일을 한다. 농사의 시작을 땅과 하늘, 자연에 고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시농제 같은 제를 올리기도 한다. 씨앗들을 모아두고 씨앗이 자랄 밭과 그 생태계의 존재들에게 거듭 묻고 함께 잘 키워달라 부탁하는 셈이다. 추위에 약한 박과(오이, 호박, 참외, 수세미)와 화본과 일부(벼, 옥수수, 수수)와 생강과 토란도 부지런히 심을 때가 왔다. 뭐든 심어도 되는 때라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
만상일이 지나서 오는 서리는 쎄지 않아서 제법 견뎌내기에 7일을 중심으로 안심하고 심는다. 그런데 5년 전부터는 13일, 18일에도 예기치 않은 된서리에 심어 놓은 고춧모들은 죽어 모를 떼우는 일이 많았다. 예상치 못한, 다르게 말하면 전 같지 않은 늦서리가 반복되는 중이다.
욕심을 부려 일찍 심었다가 된서리에 녹은 옥수수 모종, 그런데 일찍이 키운 토마토 모종(오른쪽)은 튼실하게 컸다. 사진_배이슬
자주 광대나물은 진안이 따숴지면 보이기 시작했다(왼쪽). 따뜻한 시간을 사는 식물들을 심을 때가 되었다. 사진_배이슬
울긋불긋 산벚 피면 못자리하고 하얗게 조팝나무 피면 모내기 하던 농사는 옛말이 되었다.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는 봄이 기쁜 게 아니라 무섭고 슬픈 것이 농부의 마음이다.
논, 밭에게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논, 밭의 이야기를 듣는 일, 돌려 줄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함께 농사짓는 동지로서 생태계와 소통하는 삶의 지혜를 더듬어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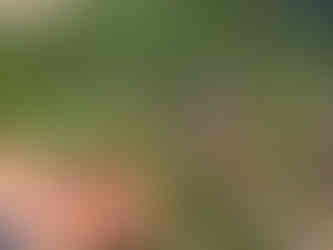









Comments